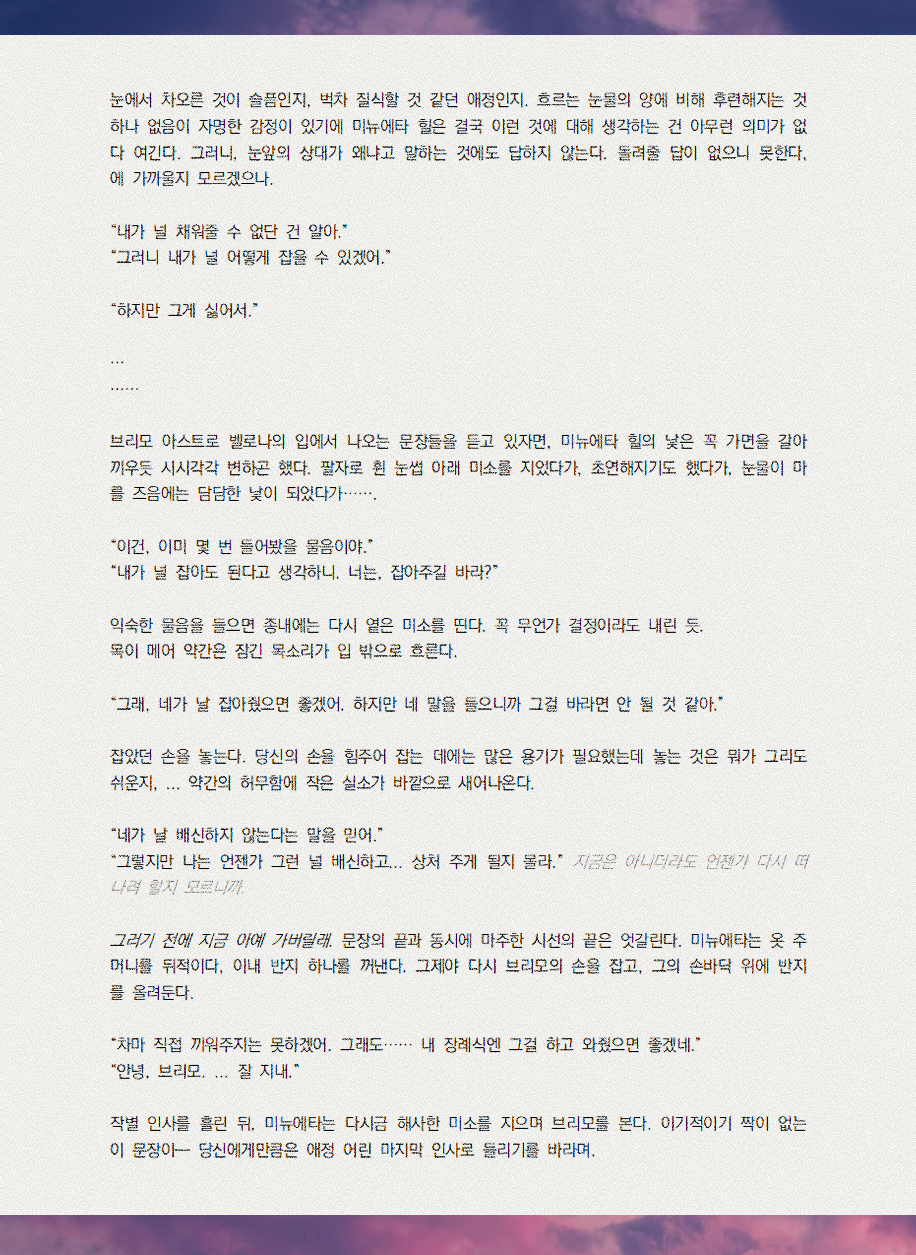눈앞의 이에게서 보이는, 의미를 알 수 없는 낯선 눈물에는 해답이 없었다. 그저 흘러 떨어질 뿐이었다. 명백한 것이라면 많지 않은 몇 가지 사실뿐이었다.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으며, 한 명이 떠나갈 예정이라는 것.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. 그리고─
눈앞에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표정이 눈에 담긴다. 눈물길이 잦아들고 표정 변화도 멎었다. 아니, 무언가 이미 눈물 속에서 흘러내린 것인지도 모른다. 그는, 그것을 알 수 없었다.
"그래, 네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어. 하지만 네 말을 들으니까 그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."
잡았던 손에서 손이 빠져나간다. 그간 내밀면 상대 측에서 잡아오고, 상대가 내밀면 잡는 식의 일들이곤 했다. 지금 이 순간에 떠나갈 당신의 손을 잡아보는 것은, 그 안에서 머무르는 손을 확인하듯 몇 번 쥐어보는 것이 거짓말이라도 되듯 빠져나가는 것은 모래알갱이가 흐르듯 했다. 그렇게 빈 손이 되었다. 서늘한 것은, 그가 지닌 본연의 온기 때문일까.
"네가 날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."
"그렇지만 나는 언전게 그런 널 배신하고..., 상처 주게 될지 몰라."
"그러기 전에 지금 아예 가버릴래."
귓가에 닿는 말들이 생경하기만 하다. 하지만 어째서인지. 네가 날 상처줄 수 있다고 생각해? 라는, 그에게 있어 아주 어렵지 않을 법한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. 비슷한 말로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일이 한두 번은 아닐 텐데도. 그 대상이, 눈앞의 당신이기 때문이겠지. 그런 당신이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늠하고 주저하는 것인지, 그는 알 수 없었다. 당신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을 리도 만무했다.
엇갈린 시선 끝에서 당신의 손은 다시금 그의 손을 잡아 든다. 그 위에 작은 것이 하나 올려진다.
"차마 직접 끼워주지는 못하겠어. 그래도……, 내 장례식엔 그걸 하고 와줬으면 좋겠네."
"안녕. 브리모. … 잘 지내."
퍽 건조할 시선으로 손바닥의 것을 내려다보던 이의 귀에, 당신의 말이 닿는다. 느릿하게 시선을 옮기면,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바라보는 미뉴에타 힐이 있다. 부드럽게, 아무렇지 않게 이어진 문장 끝의 미소는 여느 때보다도 그려낸 듯 맑았다. 그 사이의 괴리감은, 그의 몫이었다.
"장례식. 이라고."
뇌리에 박힐 듯 선명한 단어를 제 입으로 읊어본다.
당신을 잡을 수 있을 리 없다. 당신을 잡아서도 안된다. 그리 여겼다.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. 언제건 이별은 찾아올 것이라 여겼다.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.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찾는지 알기에. 하지만 그런 당신에게 자신이 두려움이 될 줄은 몰랐고, 이별 끝에 다가올 것이 죽음이라고는 더욱이 생각하지 않았다.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.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이었기에, 모든 죽음 위에서도 그것을 짓밟고서 묻어두고 숨을 쉬고자 턱을 치켜들 사람이었기에. 하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이었기에.
손 안의 것을 움켜쥐고, 다른 손으로 당신이 물린 손을 쥔다.
"잡아주길 바란다고 하고, 장례식에 와달라고."
"그러면서도,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."
무얼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, 물음은 아니면서도 확인하는 것마냥 하는 말의 연속. 그는 자신의 표정을 알 수 없었다. 알 수 없을 것이다. 무엇이 당신의 손을 쥐게끔 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.
물론 그는 분명 당신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갈 것은 분명했다. 지금까지처럼. 당신의 무게가 그의 안에 더해질지는,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. 그럼에도.
"너도, 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야. 그러니, 내 곁에 있는 게 무섭다는 널."
"죽음으로 향하겠다는 널."
"그럼에도, 네가. 내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."
"너를 붙잡아 두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겠지."
그는,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. 그는 알 수 없다. 그저, 손안에 쥔 작은 손을 얽어 쥐고 있다는 것 밖에. 다만 이 순간, 그는 제 안의 붉은 것이 내는 소리를 들은 듯도 했다.